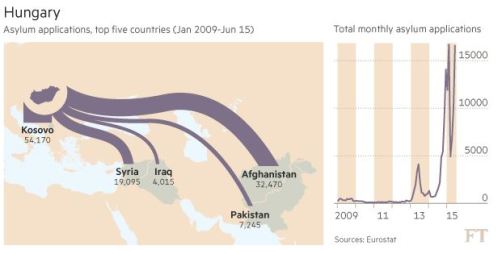어제 페북에 올린 글을 옮겨 둔다.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이 심상치 않다. 일요일만 해도 대규모 시위 정도로 뉴스를 흘려 들었는데, 어제는 최루가스와 물대포가 등장했다. 주말 시위는 규모가 컸고 노인들과 가족들이 주축이었다. 많은이들이 처음 시위에 참여했었다. 반면 어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주였고, 그만큼 과격했다고 들었다.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신분을 숨기면서 최루탄을 대비하고 어느정도 충돌까지 각오하고 나왔다.

(사진 출처: ABC News)
오늘 아침 NPR 뉴스를 듣는데 감정이 동하더라. 기자가 시위현장에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8세 소녀를 인터뷰 했다. 기자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홍콩을 떠날 생각도 있는가 물었다. (나는 바보 같은 질문이란 생각이 살짝 들었다.) 의사가 되는게 꿈인 그 소녀는 가끔씩 떠날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치만 여기가 내 고향이고.. 그런데 여기. 살기가 참 힘드네요 라고 대답하고 울음을 떠트렸다. 울음을 멈추고서 소녀가 이어서 한말은 베이징 사람들은 홍콩사람들이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기에 그럴수 없다. 홍콩인들은 결코 베이징에 복종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잇는다.
경계인. 어찌보면 나하고 별 상관 없는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내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경계인인 나의 정체성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10년이 조금 못되게 미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한국도 조금은 멀어진 경계인이 되어간다. 딸아이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미국에서 친구들과 있으면 걔네들은 자기가 동양 사람 같다고 하고, 한국에 가면 미국애 같다고 한단다. 딸애 말에는 비감이 1도 섞이지 않았건만 나는 슬프게 들리더라.
홍콩은 참 독특한 곳이다. 이를테면 영국식 ‘tea culture’와 중국의 ‘차 문화’가 짬뽕되어 있다. 호텔 같은 곳에 가면 영국식으로 밀크티에 스콘과 케익을 곁들여서 즐길 수 있지만 바로 길건너 시장만 가도 중국식 차를 길거리에서 딤섬과 먹는다.
공교롭게도 차는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유중에 하나이기도 했다. 영국사람들은 대항해 시대에 중국이 재배하는 차에 맛을 들였다. 영국인은 차를 대신해서 은을 교환했었다. 그러나 금새 영국 은은 바닥이 났고 대안으로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보급한다. 그래서 시작된 아편 전쟁에서 영국은 승리했고, 홍콩을 중국에서 99년간 빼앗는 조약을 맺었다.
영국인은 홍콩에 영국 문화를 이식한다. 식민지배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었겠지만, 100년의 시간은 그들을 중국인도 아니고 영국인도 아닌 홍콩인이 되게 했다.
2002년에 나는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갔었다. 그때의 경험이 나를 일종의 globalist로 만들었다. 나는 마냥 젊었고, 인종/성별/언어/나이에 관계없이 섞여서 어우러지는 그 감흥에 취했다. 그때 알았던 홍콩 출신 게리가 가끔 생각난다.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북부 출신, 남부 출신, 내륙 출신 모두 달랐고, 대만과 홍콩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그중에서도 홍콩 출신이라면 왠지 모를 세련된 느낌?
홍콩은 이제 예전 같은 위상이 아니다.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던 곳이나, 지금은 중국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서 경제력이 크게 낫지도 않다. 바로 마주보는 선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지금의 홍콩은 시설이 낡고 오래된 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년의 식민지 경험은 홍콩을 독특한 곳, 그러니까 영국도 중국도 아닌 곳으로 만들었다. 홍콩인이 자신을 홍콩인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건 아이러니 하게도 5년전 있었던 우산 운동이 계기였다. 우산운동은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실패한 혁명이다. 시위 주동자들은 지금 모두 감옥에 있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더욱 강화했다.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정치에 별 관심이 없던 홍콩의 중산층이 자신을 홍콩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홍콩대에서 연구한 여론 조사를 본적이 있다. 우산운동 이전까지는 자신을 홍콩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답한 사람이 점차 느는 추세였으나, 우산운동을 기점으로 추세가 역전이 되었다.
그리고 홍콩인 들은 천안문 사건을 추모하기 시작한다. 매해 빅토리아 공원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천안문에서 죽은 학생들을 기억한다. 그 행사는 매년 커져서 수천명이 모이는 행사가 되었다. 정작 중국에는 천안문에 대한 언급 조차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홍콩은 (마카오를 포함) 유일하게 그것이 허용된 곳이다. 지난주에 있었던 30주년 행사도 몹시 컸다. (관련 뉴스 영상 아래) 올해가 마지막 합법적인 행사가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람들이 더욱 몰렸다.
생각해보면 그들의 추모라는 건 참 우울하기 짝이 없다. 홍콩인들에게 30년전 천안문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찌보면 별 연관이 없다. 그때는 아직 영국의 통치아래 있었거든.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건에 크나큰 동질감을 느끼는 거다. 거대한 중국의 힘앞에서 어찌보면 아무 힘이 없는 저항인데,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버틴다. 공교롭게도 30년전 6월에 중국 정부는 대학생시위에 군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금도 동일하게 군대가 진군해 있다. 뭐랄까… 이럴때는 역사가 정말로 반복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언젠가 홍콩인들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다. 인터뷰어가 우산 운동이 무슨 의미냐고 묻는데, 대답한다. 역사를 바꾸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저 저항을 했었다는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