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선거는 이번주이고, 프랑스 대선은 다음달이다. 몇 주전부터 정리해보려고 맘먹었는데, 도무지 짬이 안났다. 한국 뉴스 따라잡기도 버거웠던 지난 주였기도 하고. 그래서 어설프지만 너무 늦어지기 전에 끄적이기로 결심.
우선 배경 설명으로 프랑스 대선에 관련 지난 포스트는 아래 링크 참조.
다가오는 프랑스 대선, 3월 3일자 포스트
관련기사 : The Economist | French politics: Fractured
Nationalism 또는 소위 ‘포퓰리즘’으로 분류되는 브렉시트/트럼프와 르펜은 여러가지 유사점이 있다.
세계화에 뒤쳐진 ‘잊혀진’ 사람들의 반란, 반이민정서/반이슬람정서에 기반, 기성정치에 대한 심각한 불신과 아웃사이더에 대한 선호,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 운동.
지난주 이코노미스트지는 르펜의 국민전선 지지도와 실업률 지도를 같이 보여주는데, 직업전선에서 소외 당한 사람들이 국민전선을 지지하는 모양새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아래 도표 참조)

런던과 타지역의 투표 양상이 상이했던 브렉시트에서 처럼, 파리와 타지역의 투표 양상은 판이하게 다르다. 아래 도표는 파리에서 멀어질 수록 국민전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국민전선의 지지자는 트럼프/브렉시트 지지자와 유사하게도 저학력층이 다수이며, 남성지지자가 월등히 많다.
이제 차이점을 몇가지 꼽자면 아래와 같다.
우선 프랑스에서 nationalism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는 것. 좀 의외이긴 한데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노동법이 강하고, 청년실업률이 높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다. 최근 유럽경기가 살아나는 추세라고는 하나, 새로생긴 일자리의 80%가 비정규 단기 (심지어는 한달 미만) 직업이기에 젊은이들의 좌절감이 크다.
관련 포스트: 마린 르펜을 지지하는 젊은이들, 3월 1일자 포스트
둘째는 옆나라 독일과 비교되는 프랑스의 위상 추락이다. 유럽을 이끄는 독일에 비해 프랑스의 각종 경제 지표는 지난 15년간 제자리 걸음이다. 이를 프랑스인들은 décrochage, 즉 decoupling이라고 한다.
또 Euroseptic의 관점으로 이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를 자신의 나라에서 이뤄지는 일들에 대해 국민들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EU는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체이다. 마린 르펜은 줄곧 유럽통합은 이뤄질 수 없는 망상일 뿐이고, 각 나라의 sovereignty 주권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브렉시트 때에 올린 글로 설명을 대신한다.
관련 포스트: Euroseptic의 관점에서 본 브렉시트, 2016년 7월 2일자
이래서는 프랑스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프랑스는 누가 뭐래도 계몽주의와 프랑스 혁명의 나라이다. 프랑스의 정신은 어디로 간것인가. 바로 르펜이 강조하는 내용이 이것이다. 르펜은 프랑스의 정신과 국민전선의 정체성을 연결시킨다. 르펜은 남부에서는 반 이슬람을 말하고, 소위 프랑스의 러스트 벨트인 북동쪽에서는 반세계화를 그리고 위대한 프랑스 재건을 말한다.
이는 마린 르펜이 아버지 장 마리 르펜에게서 당을 물려 받으면서 리브랜딩(?)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마린 르펜은 나치를 찬양하고 유대인을 혐오했던 아버지의 색을 빼는데에 주력해왔는데, 심지어 마지막에는 아버지를 당에서 제명시키는 강수를 둔다.
르펜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결선투표를 하는 프랑스 특유의 선거제가 아니라면, 지지율 기준으로 국민전선은 제1 당이 되었을 것이다. 이는 르펜이 없던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의 프랑스의 정신을 끌어다가 자신의 당의 정체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소위 laïcité 라이시테라는 프랑스 특유의 세속주의는 반이슬람 정서와 맞물려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관련해서 이전 포스트: 프랑스와 세속주의 laïcité 라이시테, 2016년 8월 30일 포스트
르펜의 반무슬림 정책이 네덜란드의 반 무슬림 정당 PVV의 Geert Wilders의 정책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 세속주의의 강한 전통을 가진 프랑스와 달리 네덜란드는 기독교 기반의 정치 전통이 최근까지 있었던 나라이기도 하다.
르펜은 RNW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RNW는 네덜란드 언론이고 해당 인터뷰는 2011년에 이뤄졌다.
“그게 바로 제가 Geert Wilders와 다른 점입니다. 그는 꾸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슬람을 반대합니다. 문자 그대로 꾸란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프랑스 정신을 벗어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에 반대합니다. 샤리아법은 프랑스의 원칙, 가치관,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That’s the difference between Geert Wilders and me. He reads the Qur’an literally: you can’t interpret the Qur’an – or indeed the Bible – literally. I resist fundamentalists who want to impose their will and law on France. Sharia Law is not compatible with our principles, our values or democracy,”
source: https://www.rnw.org/archive/le-pen-says-shes-no-wilders
르펜의 정치관 동의 여부와 별개로 르펜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가 참 명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느낌까지 주는 몇몇 (사실상 대다수의) nationalist들과 달리 르펜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정확히 알고 말을한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리고 트럼프 등장 훨씬 전부터도 반이슬람, nationalism의 기수 역할을 해왔던 르펜의 존재감으로 나타난다.
르펜은 어린 시절부터 (극우 정치인의 딸이라는 이유로) 왕따로 커왔고, 두차례 이혼을 겪으면서 생활 정치인으로 홀로 섰다. 우는 아이들을 보며 화장실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했던 에피소드도 유명하다. 그는 테러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권력에의 의지를 놓은 적이 한번도 없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든 르펜의 도전에 이제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르펜 개인사에 관한 취재 기사 : MARINE LE PEN, L’ETRANGERE, Magazine 1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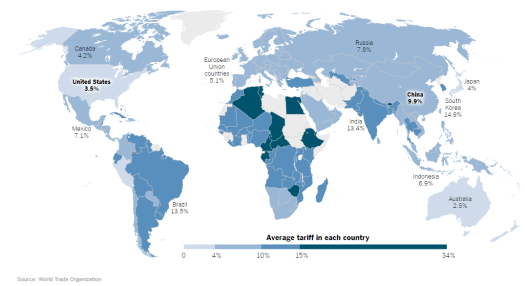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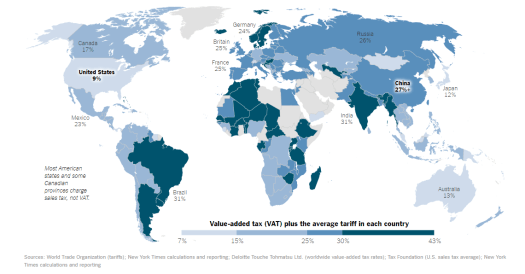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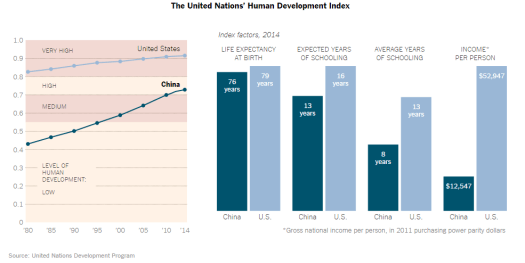




.jpg)



